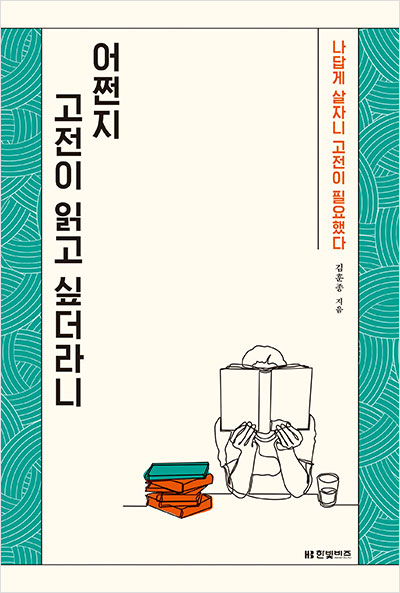삶/여가/책 >

시간時間.
과연, 시간이란 뭘까? 시간이 우리에게 던지는 본질은 무엇일까? 시간時間을 파자破子하면, 日 寺 門 日. 해日가 절寺의 문門을 통해 들어갔다가 터벅터벅 나오는 형상이다. 해日는 곧, 우주의 상징이다. 우리는 모두 나만의 우주를 지어놓고, 그 우주 안에서 살아간다. 내 마음이 우주요, 우주가 곧 마음이다. 당연한 귀결로 해는 ‘나我’의 다름 아니다.
절寺은 세속의 대척점에서 딸깍발이처럼 꼿꼿이 서 있는 공간. 세속은 대개 돈, 아니면 권력, 그도 아니면 명예로 이루어진다. 혹은 돈과 권력과 명예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절이란 장소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버린 채, 고결한 마음가짐으로 ‘속俗됨’을 모두 태우고, 한 발 한 발 겨우 디뎌 들어가는 소실燒失의 공간이다. 결국 시간이란, 우주의 중심인 ‘내’가 세속의 비루함을 모두 태워버리고, 오롯이 ‘자아自我’만을 앞세우며 홀로 서는 것이다.

현대인에게 가장 희소한 자원은 단연코 시간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일찍이 《월든》을 통해 최소한의 소비와 그에 따른 최소한의 노동을 인류의 지향점으로 강조했다. 그래야만 가장 소중한 ‘나’를 들여다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21세기의 지구인은 역사상 유래 없이 풍족한 음식과 자원을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다. 먹고, 마시고, 타고, 보고, 입고, 싼다. 자본은 소비의 향연을 연달아 몰아치며 우리를 압박한다. 나는 충분히 먹고 마시고 쌌는데, 누가 옆에서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싸면, 나도 모르게 휩쓸려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싸야 한다고 착각한다. 나를 태워 쓰러질 때까지 채찍질해서라도,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싼다. 뼈와 살이 튀는 이 아수라도阿修羅道에서 오직 내면의 목소 리에만 귀 기울일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
유발 하라리 역시 《사피엔스》를 통해 ‘현대인이 농경민보다 행복하고, 농경민이 수렵채취를 하던 인류보다 행복하다’는 우리의 편견을 통렬하게 부숴버린다. 수렵과 채취로 삶을 이어가던 조상들은 ‘먹고 싶을 때 먹고, 쉬고 싶을 때 쉬었다.’ 그들에겐 오직 현재, 오직 오늘만이 중요했다는 말이다. ‘카르페 디엠’을 몸으로 실천한 셈.
농경으로 먹을 게 늘어나 생활이 여유롭다고 느낀 바로 그 순간, 농경민들은 곡식보다 무섭게 증가하는 자식들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 정착하는 삶은 더 많은 섹스를 낳았고, 더 안정적인 섹스는 더 많은 자식들을 잉태했다. 그렇게 무섭게 늘어난 자식들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그들은 매일매일 걱정을 하게 되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창궐하는 순간, 인류는 오늘을 살지 못하고, ‘내일을 사는’ 불행하고 가련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월든》에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런 상황을 날카롭게 꼬집는다. “제때의 바늘 한 땀이 나중에 아홉 바늘 꿰매게 될 수고를 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 천 바늘씩을 꿰매느라 허리조차 펴지 못하고 있다.”
한가하다는 의미의 ‘한閒’은 문 틈새로 달을 쳐다보는 형상이다. 수렵에서 벗어나 농경을 하게 되면, 평화로움이 찾아오고 문 틈새로 실컷 달구경이나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정작 농경이 시작되니 달구경은커녕 새벽별만 구경하는 신세로 내동댕이쳐진 것이다. 싯타르타는 아들을 낳고 ‘라훌라’라고 이름 지었다. 라훌라는 ‘발목을 잡는 자’란 뜻이다. 어쩌면 싯타르타는 농경이 불러일으킨 우리 삶의 족쇄를 일찍이도 깨달은 건 아닐까.
탱탱하고 싱싱한 새우를 그저 하루 먹을 만큼만 잡던 인류는 어느덧 저장을 고민하게 된다. 새우를 잡아 싱싱한 채로 먹지도 못하고 젓갈로 담근다. 싱그러운 현재를 애써 버리고 안온한 미래를 위해 소금으로 짜디짜게 절여버린 시간. 그곳에 늪처럼 빠져든 우리들은 퀴퀴하게 곰삭은 불행의 젓갈을 맛보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다. 소설가 이승우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숙주다’라는 문장을 빌려 표현하자면, 농경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시간의 숙주’가 되어버렸다. 불행하게도 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비극의 주인공들을 분석한다. 그토록 품위 있는 인격과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그들이 시련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마르티아’에서 찾는다. 하마르티아를 우리말로 옮기면 ‘잘못’ 혹은 ‘죄罪’다. 그 잘못 가운데 으뜸은 단연 휴브리스다. 휴브리스는 오만傲慢이란 뜻인데, 여기서의 오만은 ‘신神에 대한 오만’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정의한 시간時間의 파자적 해석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태도다. 세世와 속俗을 버리고 오롯이 자아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와 속을 탐닉하는 자아가 휴브리스의 우愚를 범하게 된다.
《시학》에 등장하는 비극의 주인공들은 오직 제 잘난 맛에 산다. 그들은 종종 ‘세와 속은 물론이요, 동시에 시간까지 틀어쥐려는’ 인간의 오만방자함을 여실히 드러낸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유언 속 ‘이기는 것만 알고 지는 것을 모르면, 그 피해는 너에게 돌아간다’는 문장은 바로 이 비극의 주인공들을 준열하게 꾸짖는 말이다.
그렇다면 권력, 돈, 명예 같은 세속적인 가치를 죽는 그날까지 추구했으면서도, ‘세속적 가치를 지나치게 탐하면 벌을 받는다’는 모순된 유언을 남긴 ‘세속의 화신化身’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심리는 과연 무엇일까? “시끄러우니까 제발, 소리 좀 지르지 마!”라고 고래고래 외치는 인간처럼 혹은 “제발, 지폐를 훼손하지 마시오!”라고 만원 지폐에 휘갈겨 낙서한 사람처럼 모순 덩어리인 그의 심리를 해부해보면, 결국 그의 마음속 깊은 울림은 ‘후회’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후회後悔란 먼 훗날後 마음으로忄(心)하는 것인데, 안 타깝게도 매일每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어 ‘매일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후회다.

‘나를 이기고자 하는’ 공자의 실천 방안은 그래서 역설逆說이고 동시에 진리다. 왜 역설이자 동시에 진리인지 이해하려면 공자가 살던 춘추전국시대의 공기를 느껴봐야 한다. 먼저 철기의 보급으로 농업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수렵채취에서 농경으로 정착했을 때보다, 청동기에서 철기로 변화할 때 농업 생산력은 극적으로 증대된다. 당연하게도 그에 비례해 인구가 늘게 되고 생산력 증가에 따른 여유 시간은 철학을 잉태하게 된다. 이 시기에 제자백가 사상이 나타나 중국 철학사의 근간을 이룬 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오늘만 살던 세상’에서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세상’으로 또 한 단계 진화했다. 물론 이 전진이 과연 행복인지 불행인지는 평가를 유보하겠다. 껑충 뛴 경제력을 바탕으로 춘추전국시대 의 인간은 ‘예禮가 아닌데도 매일 말하고, 예가 아닌데도 매일 듣 고, 예가 아닌 것만 유독 찾아보게 되는 인류’로 바뀌게 된다. 순리를 거스르는 인간. 오늘의 자아에 집중하지 못하는 인간. 내일만 걱정하고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 공자는 그 시점에 탄생한 신인류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자기를 극복하고 결국 오늘을 제대로 사는 인간이 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 셈이다.

출처 : 영화 <아저씨>
이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공평한 게 하나 있다. 당신이 부자든 빈자든 공평한 것. 당신이 권력을 쥐고 있든 기층민중이든 공평한 것. 당신이 착하든 악랄하든 공평한 것. 당신이 똑똑하든 멍청하든 공평한 것. 그것은 바로 시간이다.
몸에 억만금을 두른 자도 결국 죽는다. 온 세상을 통일해 쥐고 흔들던 권력자도 결국 죽는다. 기껏해야 백 년이다. 이 얼마나 공평한가. 영원한 건 절대 없다! 천하대세(天下大勢) 분구필합(分久必合) 합구필분(合久必分). 나관중이 《삼국지연의》의 첫 문장으로 선택한 말이다. 천하의 대세는 나누어지면 반드시 합쳐지고, 합쳐지면 반드시 나누어진다. 유일하게 평등한 것, 다시 말해 ‘시간’을 진솔하게 소비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평등해진단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영화 〈아저씨〉에서 원빈이 내뱉은 대사가 유독 살갑게 다가온다. “내일만 보고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난 오늘만 산다.” 나도 진정한 위너가 되고 싶다.
이전 글 : 호주에 여행간다면 꼭 해야할 체험 BEST 7
최신 콘텐츠